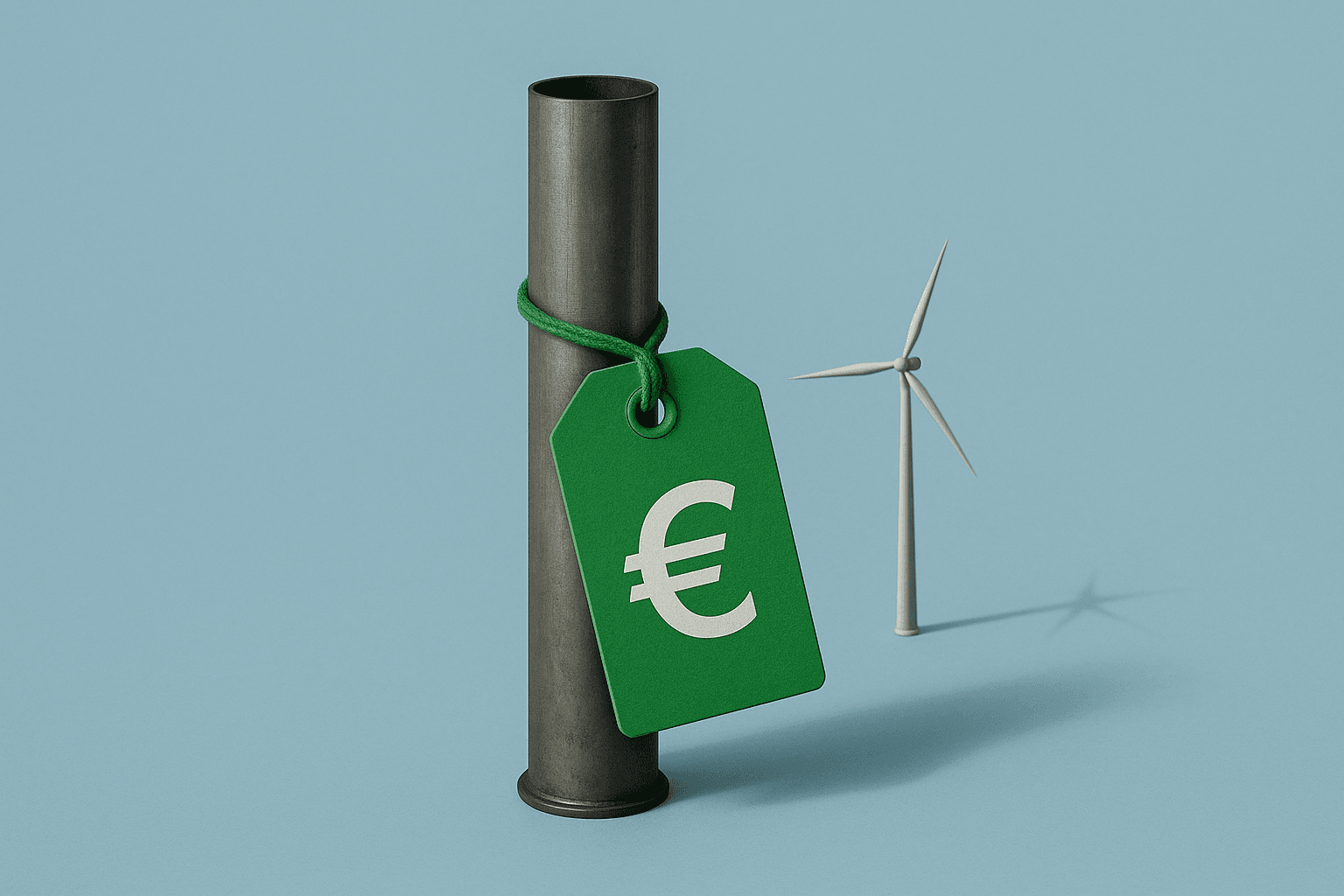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2029년까지 50%로 확대돼요. 발전사와 제조업체들은 연간 수조 원대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어요.
발전·제조업 직격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29년까지 50%로 확대되면, 발전사들의 연간 배출권 구매 비용이 1,955억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급증해요. 이로 인해 전력 생산 원가가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져 제조업 전반에 추가적인 원가 부담이 전가돼요.
특히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은 연간 수천억 원대의 전기요금 인상과 직접적인 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요. 발전사들은 비용 부담을 전력 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지금 확대하나
이번 유상할당 확대 정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CBAM은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의 EU 수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한국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해 EU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국내 배출권 가격이 EU보다 낮은 상황에서 급격한 유상할당 확대는 국내 기업에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친환경 기업엔 기회
유상할당 확대는 친환경 기술 기업, 특히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요. 정부가 CCU 메가프로젝트에 9,000억원을 투입하고, 배출권 경매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린케미칼, KC코트렐,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등은 탄소 감축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하며,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기업이에요.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들도 화석연료 발전의 비용 부담 증가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어요.
현실의 벽 높아
제조업계와 재계는 유상할당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예상되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이견이 커 정책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배출권 시장은 유동성 부족, 제한된 참여자 등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시장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요.
한국만 급진적
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등은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지만, 전기요금 보전 등 사회적 환류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무상할당 위주 또는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한국만 급격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국제 경쟁력 저하와 탄소누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결론
탄소배출권 50% 유상할당 정책으로 발전사와 제조업체들은 연간 수조 원대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어요.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 구매 비용이 겹치면서 수출 중심 제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반면 CCUS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 9,000억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어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유상할당 속도를 조절하고,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해야 해요. 특히 EU의 CBAM 시행 시점인 2026년까지 국내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조업계의 반발로 정책이 수정되는지가 시장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거예요.